[칼럼]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 탈북민에 대한 비하발언에 답한다?

본문
“왜 정치에 나서느냐”고 묻기 전에 묻는다. 우리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의 발언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먹고 살기 힘들어 왔으면 조용히 살아라”, “왜 정치판에 기웃거리느냐”, 혹은 “정치적 야망 때문 아니냐”는 폄하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탈북민들조차 인권활동가들에게 “우리는 경제난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왜 괜히 정치에 엮이느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정치 참여는 인권 그 자체다.
정치적 권리는 인권의 한 축이다
국제인권규범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고 말이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이러한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투표는 형식적이며, 정치결사는 범죄로 간주되고,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정치의 의미를 배우고, 인권을 외치는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행위는 단지 ‘정치적 야망’이나 ‘여론몰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박탈되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인간의 본능이자 권리의 행사인 것이다.
왜 탈북민 인권활동가는 정치에 민감한가
정치는 인권의 구조를 결정한다.정부의 대북정책 하나로 수천 명의 탈북난민의 생사가 갈린다. 정치적 결정이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어느 날은 생명을 건 귀환이 되고, 어느 날은 조용한 죽음으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에 대한 민감함은 곧 생존을 위한 감각이다. 정치가 인권을 억압하면 그것은 독재이고, 인권이 정치를 견인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론을 제기하고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인권적 본분이다.
탈북민 사회의 정치혐오와 냉소를 넘어
탈북민 공동체 내에서도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경멸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과거 북한에서 정치가 공포와 억압의 도구로 작동했던 경험에 기반한 집단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집단적 냉소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뿐이다. 침묵이 미덕인 사회에는 변화를 위한 힘도, 연대도 존재할 수 없다.
정치는 우리가 침묵해도 우리를 지배한다. 침묵을 권유하는 문화 속에서 탈북민들이 사회적 약자로 머무르기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침묵을 선택할 권리만큼, 발언을 선택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탈북민의 정치 참여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우리는 이제 탈북민 출신 정치인이나 인권활동가를 향한 편견과 혐오를 넘어서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진실을 바탕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사회적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기둥이다. 이를 ‘건달’, ‘정치꾼’이라며 폄하하는 행위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문명적 행위라 할 것이다.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북한이라는 억압체제에서 탈출해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자유의 가치를 완성하는 정치의 주체로 서야 할 때다.
정치는 인권의 결과이며, 인권은 정치의 방향이다
탈북민 인권운동은 단순한 구호나 불쌍함의 호소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폭력의 기억을 기록하고, 사회정의를 향한 연대를 제안하는 정치행위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에 나서는 탈북민’을 이상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권의 증인이고, 정치의 시민이며, 자유를 회복한 주체다.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자유를 말할 권리도 함께 누려야 한다.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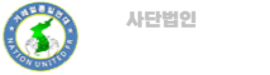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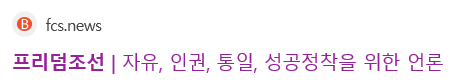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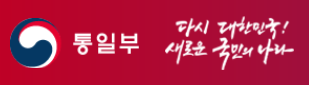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