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충성, 처절한 죽음 ― 러시아 전선에 내몰린 북한군인들의 인권비극

본문
최근 연대는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근로자 A씨와의 통화를 통해, 평양에서 국가장례로 치러진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들의 장례식과 그 이면의 비극적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러시아 국민들도 북한군 병사들의 실상을 알고 있다. 그들을 영웅이라 칭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국민이 많다”고 증언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영광의 전사’라는 허울과 달리, 강요된 선택 속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범죄의 희생자’로 비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 북한군 출신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인민군 병사들에게는 “적에게 절대로 포로가 될 수 없다”는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규율이 아니라, 가족을 볼모로 한 생존의 강요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A씨는 이를 설명하며 한 가지 일화를 전해주었다. 과거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러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충성심 검증을 위해 양국 경호원들에게 8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스탈린의 경호원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며 거부했으나, 김일성의 경호원은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려 했다. 만류하는 이들에게 그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곧 북한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개인의 목숨보다 가족의 생존이 우선되는, 강제된 충성과 세뇌된 복종의 구조 속에서 북한 병사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 전장에서의 ‘강요된 죽음’
러시아 전선에 내몰린 인민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는 단순히 전쟁의 참혹성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가족을 지킨다’는 믿음을 강제로 주입받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에서 싸운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단순한 전쟁 희생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이들을 포로로 잡히는 대신 죽음을 택하게끔 몰아넣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전시 포로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인민군 병사들의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담보로 강제된 국가 범죄의 산물인 것이다.
인권의 시선에서 본 북한군 전사자의 장례
평양에서 국가장례로 치러진 북한군 전사자들의 죽음은 정권의 선전에선 ‘영웅적 희생’으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강요받은 인간들의 처절한 최후다.
러시아 국민들이 이들을 ‘영웅’이 아닌 ‘불쌍한 희생자’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올 권리조차 빼앗긴 채, 죽음을 통해서만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이 잔혹한 구조야말로 북한 체제가 만들어낸 대표적 인권 범죄이다.
러시아 전선에서 쓰러진 북한 병사들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강요된 충성, 세뇌된 복종, 가족을 볼모로 한 체제 범죄의 집약체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죽음을 ‘전사(戰死)’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로 기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강요한 충성의 죽음 뒤에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의 눈물이 있으며, 이는 결코 ‘영웅 서사’로 치환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군인들의 처절한 죽음을 ‘기억’하고, 이 구조적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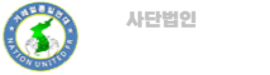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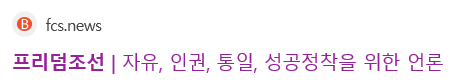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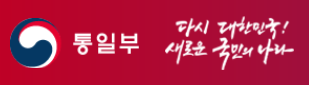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