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인권피해 탈북여성 수기2

본문
3장
죽음의 문턱에서
죽고 싶었다. 아니, 죽을 수 있기를 바랐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고통이 계속되는 한, 살아 있다는 사실은 저주였다.
어느 날은 감방 모퉁이에 몸을 숨겨 도구를 찾았고,
어느 날은 단추 하나 없는 옷을 보며"죽을 길조차 막혀 있구나"라고 탄식했다.
내 목숨이 내 손에 있었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
내게 남은 건 오직 생존하는 고통뿐이었다.
내가 약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괴로웠다.
작은 상처에도 호들갑을 떨며 약을 찾던 내게,
병든 몸을 굴려 맞고 굶고 깨우치는 일상이란 벌거벗긴 정신을 태우는 형벌이었다.
“간나야, 암승냥이 같은 것!”
그들의 욕설은 가죽을 찢는 채찍이었고,
감방 안의 나는 점점, 내가 짐승이라는 말에 동의해가는 존재가 되어갔다.
부모님조차 나를 그렇게 보게 될까봐… 그 수치심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분노로 반항했다.
죽여달라고 외쳤고, 계호원들과 맞섰고, 철창에 매달려 감방 전체에 벌을 안겼다.
죄수들이 나를 원망했고, 나는 그들에게 밥을 나눴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증오가 연대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인간’으로 다시 보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나는‘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살아야 한다’는 또 다른 분노를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분노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나는 싸우고 싶었다.
내가 죄인이 아님을, 이 고통이 정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몸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사지가 무너질 정도로 맞았고, 하루에 한 컵 분량의 피를 쏟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모든 고통이 지나고 나면
몸은 다시 일어섰고, 상처는 새살로 메워졌다.
“죽음이란, 생각보다 멀고 생은 생각보다 질기다.”
나는 그 질긴 생명을 바라보며
육체가 나를 버리지 않는데 정신이 포기할 수는 없다는,
아들 앞에서 엄마로 살아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서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싸우기 시작했다.
보위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이 쓴 문건 하나하나를 반박했고, 진실을 밝혀나갔다.
그 과정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매 순간, 죽기 위해 아니라 살기 위해 싸웠다.
아니,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끝에서,
나는 다시금 생을, 그리고 자유를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4장
자유를 향한 싸움
죽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고통에 순응하던 죄인이 아니라,
억울함을 증명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저항자가 되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조사 문건은 이미 조작되어 있었고,
내 죄는‘정해진 사실’로 다뤄지고 있었다.
나는 말해야 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리고, 싸워야 했다.
보위부에 배치된6명의 보위원—
그들은‘조사관’이 아니라‘판결자’였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체제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상대로
말로, 증거로, 인간으로, 존엄으로 맞섰다.
한 명을 넘기면 또 한 명이 바뀌었다.
그들이 교체될 때마다 조사방식은 바뀌었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기록을 바로잡고, 왜곡을 지우고,
단 하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었다.
존재의 싸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구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만 했다.
감옥은 감방보다 더 혹독했다.
취급실에서는 얼굴에 멍이 들어 흑인처럼 보일 만큼 맞았고,
이불도, 옷도 빼앗긴 채 마룻바닥에 밤새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죽더라도 진실을 고수하겠다는, 오직 하나의 의지만이 나를 지탱했다.
나의 저항은 단지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약속,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고통의 정당성을 부정해야만 했다.
계호원들은 비웃었다.
“니 간나가 얼마나 악질인가 보자.”
“죄를 인정하면, 옷을 돌려주겠다.”
그러나 나는 얼어죽을 각오로 고개를 들었다.
차라리 벗겨지고, 맞고, 굶더라도
굴복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죽고 싶다는 마음 대신,
내가 진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움텄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하루 한 숟갈의 밥, 맹물 같은 국 한 모금으로 연명했지만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강한 건, 자유를 향한 의지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권리.
그것이‘자유’였다.
김채연씀
[다음호에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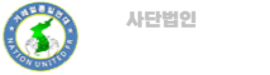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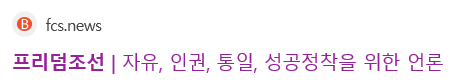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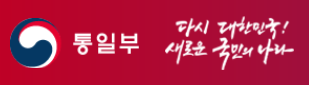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