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인권피해 탈북여성의 수기1

본문
프롤로그
봄, 그러나 자유를 몰랐던 나
봄이었다.
푸르른 나무 사이로 붉고 흰 철쭉꽃들이 거리마다 만개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처음 맞는 봄은 그저 눈부셨다. 황홀했다.
그런데 문득,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된 봄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연조차 가난했던 땅.
북한에는 도시미화를 위한 꽃조차 보기 힘들었고, 산은 벌거숭이였으며, 바람마저 허기졌었다.
철쭉이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 붉은 꽃이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그 눈부신 군락이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니, 그 땅에서는 자연이 아니라, 생존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자유의 땅에서 봄을 맞으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는 그때 정말 자유로웠던가?’
북한에서 "자유"를 되찾았다고 안도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나는 안다.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 잠시 열린 창문, 쇠창살 너머 잠깐 스쳐간 바람과 같았다.
밤이면 가끔, 그 시절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눈을 뜨면 이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리고 다시 다짐한다.
그 어떤 계절보다 찬란한 이 봄,
나는 진짜 자유를 처음으로 살고 있다고.
1장
국경의 삶, 그리고 감금
나는 국경에서 태어나 자랐다.
압록강을 사이에 둔 국경의 마을, 그곳은 풍요롭지도 찬란하지도 않았지만, 나에게는 유년의 모든 것이 깃든 곳이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국경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 역시 이 강 너머의 세계를 오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밀수—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직업’이었다.
국가는 말했지만, 배고픔은 듣지 않았다. 규칙은 있었지만, 생존 앞에서는 모두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안식처도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방황, 가정의 불화, 갑작스레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들과 전화로 거래하며 장사를 시도했다.
그 시작이, 나를 지옥의 입구로 데려갈 줄은 몰랐다.
단속은 전광석화처럼 들이닥쳤다.
불법 휴대전화 사용—나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곧장 도보위부 반탐처 구류장에 넘겨졌다.
집안의 막내로 사랑받으며 자란 나는, ‘죄인’이라는 단어조차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죄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떨어졌다.
처음 구류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말로만 듣던 감옥, 영화에서 보던 쇠창살 너머의 세상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심지어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질서는 악몽이었다.
삶의 형식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우기 위한 통제의 기술이 철저히 작동하고 있었다.
감방에 들어서자마자, 계호원은 ‘감방 규정’을 적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한 자도 틀리지 말고 10분 안에 외워라.
틀리면, 감방 전체가 벌을 받는다. 눈을 굴리지도,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된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앉을 수는 있지만, 몸은 움직여선 안 된다.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손가락을 까딱해서도 안 된다.
물 한 모금, 화장실 한번조차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승인은 내려지지 않았다.
하루 세 번의 소변, 오전 9시에 제한된 짧은 대변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종일 양반다리로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숨조차 죄스럽게 참으며 ‘움직이지 않는 벌’을 살아야 했다.
나는 알았다.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는 곳이라는 것을.
김채연씀
[다음호에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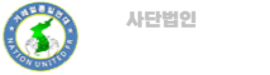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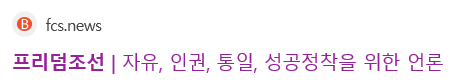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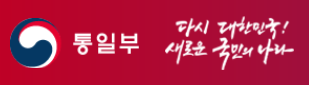

댓글목록0